다시 시작된 정론 투쟁 외면하면 언론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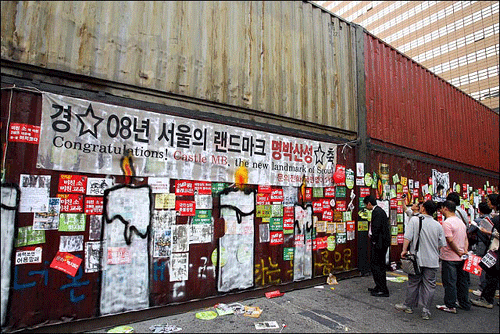
이명박 정권도 이제 해름에 들어섰다.
헌데 해름치고는 참 고약한 광경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하루를 정리하고 이제 평안을 찾아 돌아가는 노을 비낀 그 길이 아니다. 길을 돌아 설 때마다 부정과 부패의 악취가 풍긴다. 코가 얼얼하다. 비리를 더 큰 비리로 덮고 막아 마비시키는 기막힌 현상을 보고 있다.
우리 권력사의 끝물 현상 아니냐고 눈 돌리지 말자. 어느 정권은 달랐냐고 체념하지 말자. 자칫 우리는 이 같은 체념의 프레임에 놀아날지도 모른다. 누가? 바로 이 정권이 조성하고 육성(?)해 온 이른바 언론들이 있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정권의 끝물에 드러나고 있는 권력의 악취는 예정된 향연이었다.
언론사들의 보살핌을 받는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의 형질은 무엇인가. 권력의 보살핌을 받는 언론사들이 있다면 그 언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권력과 언론이 한 몸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던가. 꼭 답을 들어야만 알 만큼 우리 현대사는 순탄치 않았다. 뼈저린 교훈을 남기고 새겼다. 그 축적된 교훈의 역사 위에 우리 민주주의는 자라왔다.
모두가 겪은 민주주의의 단련을 통해 이젠 뿌리를 내렸거니…,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거침없이 탄생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벌건 대낮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일식에 갇힌 듯 한순간에 어두워져 버렸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정의 한다면 ‘명.박.산.성’, 이 4글자에 담겨 있다. 공교롭게도 현 정권은 스스로 ‘이명박 정부’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바로 광화문 광장에 ‘명박산성’을 쌓았다. 단절의 시작과 권력의 상징이 이보다 더할까.
성문을 열 때, 광장에 나서야 할 때를 아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문을 열어야 할 때 문을 잠그고, 광장에 나서야 할 때 성을 쌓았다. 지난 4년 내내 명박산성은 엄존했다. 허물어지기보다 오히려 더 강고해 졌다.
이 무모한 용기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장악된 언론’에 있었다. 소금을 뿌려야 할 때 설탕을 들이 붇던, 그 언론의 감미에 마비된 권력의 부패된 실체가 이제 쏟아지고 있다.
한편으론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언론인들의 외침과 무리가 천둥이 되고, 강이 되고 있다. 엠비시, 케이비에스, 연합뉴스, 와이티엔 등 해고와 불이익에 맞서며 바로 70·80년대 그 시절처럼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이른바 G20이니, 선진국 국격이니 농하던 이 정권 하에 벌어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다.
다시 언론을, 언론의 자유를 외쳐야하는 되돌이표 민주주의 앞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 종이신문 조·중·동과 트위터 ‘콩·국·수’(공지영 작가, 조국 서울대 교수, 이외수 작가의 이름을 딴 조어)가 당당히 맞설 만큼 우리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제도권 언론의 위기이다. 이 위기를 자초하고 가속시킨 주범이 바로 오도된 언론이다. 언론이 언론을 향해 싸워야한다. 생존의 싸움이면서 존엄의 싸움이고 자유의 투쟁이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향해 해고와 사법의 위협을 마다않고 싸우는 언론인들을 외면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언론이 침묵하는 언론 투쟁, 더 무서운 민주주의의 후퇴를 잉태한다. 이 엄청난 언론의 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미래 권력을 다지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더 두렵다.
이병완
<광주 서구의원·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