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하운의 ‘개구리’에 얽힌 사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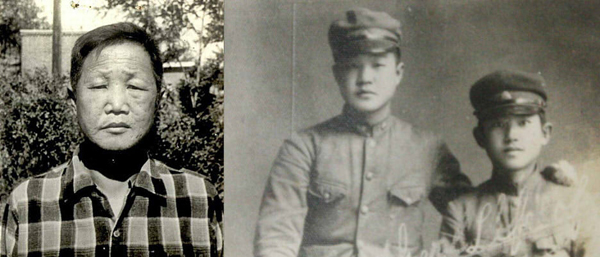
개구리 울음소리를 노래한 시가 많을 것 같지만 막상 찾아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시를 찾기가 힘들다. 동시에는 그래도 꽤 있는데 시에서는 찾기 힘들다. 백석에서도, 정지용에서도, 김소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잘못 헤아렸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 같다. 모내기 철, 이 무렵 우리나라 온 들판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를 붙잡아 쓴 시가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우리 시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공백으로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해 본다. 다행히 ‘문둥이 시인’으로 알려진 한하운(韓何雲 1920∼1975)의 시에 ‘개구리’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 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다. 아래에 전문을 들어본다.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그기 가.
라랴 러려
로료 루류
르리 라.
이 시는 한하운이 1949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동시’로 볼 수 있는 시다. 물론 한하운은 이 시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시인이 처음부터 ‘동시’를 쓰겠다고 마음먹지 않고 쓴 시인데도 동시로 볼 수 있는 시가 꽤 있다. 김소월이 1922년 1월 ‘개벽’에 발표한 ‘엄마야 누나야’, ‘개아미’, ‘부헝새’ 같은 시가 바로 그런 시다. 김동환의 ‘북청 물장사’(1924), 복동의 ‘단풍잎’(1924), 최서해의 ‘시골 소년이 부른 노래’(1925) 같은 시도 마찬가지다.
(다음 호에 이어서 씁니다)
김찬곤
광주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