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봉리 어매들의 그림속 인생 -03] 김점순

“송쿠(소나무껍질) 벳개다가 몰려갖고 쿵쿵 찌서서 뽀수가갖고 물에다 너서 불려갖고 송쿠 밥도 하고, 송쿠 갈아서 떡도 쪄묵고. 그때는 맛난가 안맛난가 그런 생각도 없어, 배가 고픈께 묵었제. 쑥이 너울너울 올라올 적에는 캐다가 쑥밥 해묵고 쑥국 낄여묵고. 옛날에는 쑥 없었으문 어찌 살았으꼬. 숭년에는 쑥이 있어야 부황도 안나고. 쑥밥 묵어싼 사람은 그때 질려갖고 맛난 쑥떡도 안 묵더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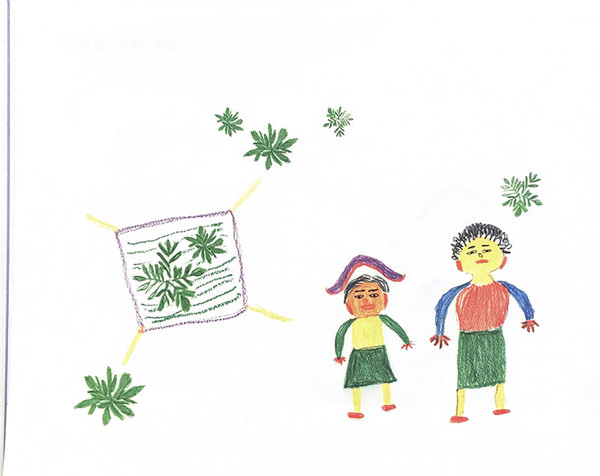
가곡떡 김점순(83) 어매의 어린 시절 봄날의 기억엔 ‘송쿠’와 ‘쑥’이 들어 있다.
“내가 (곡성) 오산면 가곡이 친정인디 어무니 따라서 화순 북면까지 쑥 캐러 댕갰제. 거그가 그때 전장(전쟁) 때 불 질러져서 사람들이 안 살고 쑥이 많앴어. 한 30리나 되까. 어무니 따라서 졸졸졸 쑥을 캠서 간께 먼중도 모르고 걸어가지제. 올 적에는 보따리다 묵씬하니 짊어지고 오제.”
‘울다가 눈물 개다’의 연속이 한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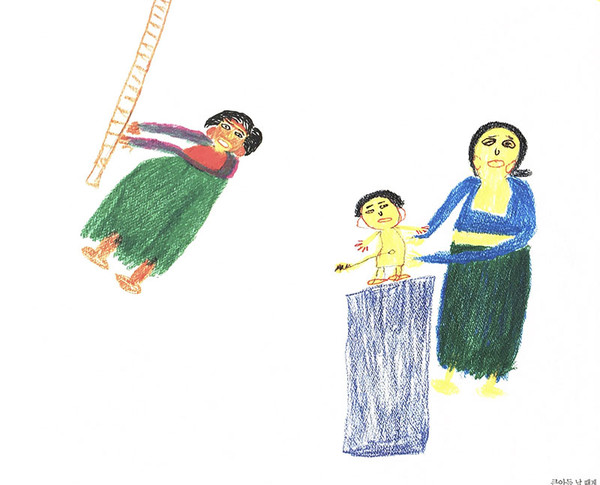
<열아홉에 시집왔제/ 눈이 많이 온 길을/ 얼룩덜룩 꽃 가마를 타고/ 울다가 눈물 개다/ 울다가 눈물 개다/ 서봉문 앞에까장 왔제…> (김점순 ‘시집 1’)
‘울다가 눈물 개다’의 연속이 한생애란 걸 어매는 그때부터 알았는게다.
<눈이 사뿐사뿐 오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려와서/ 사뿐사뿐 걸어오네> (김점순 ‘눈’)
“각시 때는 ‘시’자 붙은 것은 다 무솨. 잘해줘도 애러울 판인디 시아바이가 겁나 무ㅤ솼어. 많이 보꼈제.”
눈이 사뿐사뿐 내리는 연유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려와서’로 비쳤던 어린 각시가 사느라 생기는 설움들을 쟁이고 풀고 하는 새 어느덧 할매가 되었다.
남편은 세상 뜬 지 근 스무 해.
“살다 보문 언젠가는 서로 갈리는 날이 와. 꼭 와. 살아있을 적에 잘 해야제. 후회가 조깨라도 덜할라문. 일만 일만 많이 하고 간 것이 짠해. 노름을 그러코 해쌓더니 젊을적 불 같은 성격이 가라앙근께로 맘 잡고 일을 하더만.”
노름에 빠진 남편이 야속해서 신발을 몰래 갖고 와버린 적도 있었다.
“밤 새도락 안와. 시아바이가 알문 천불이 나고 난리가 나제. 새복에 쇠죽도 낄여야 한디. 지달코 있다가 저너메 동네로, 노름하는 그 집을 찾아갔어. 아무리 나오라고 말을 해도 안 나와. 부애 나서 내가 신랑 신발을 갖고 와불었어. 맨발로 오든지 말든지. 눈이 펄펄 올 때여.”
각시의 부애와 강단이 합해져 이룬 조용한 ‘쾌거’.
눈은 나리는데 토방에 벗어둔 신발이 사라졌으니, 신랑은 어떻게 집에 돌아왔을까. 결말은 오리무중. “금매마시, 어찌고 왔는 중은 몰겄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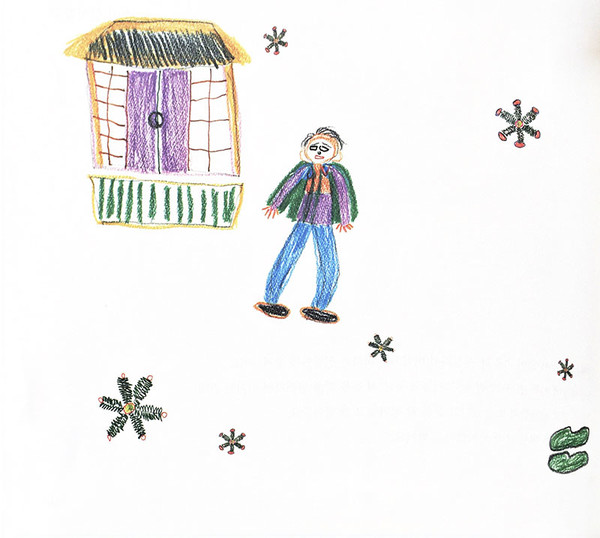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일할 봄날’
“우리 친정아부지 손을 탁해서 내가 벨라도 손이 커. 이 손으로 못할 일 없이 겁나게 했제. 근디 작년 재작년에 되게 아파갖고 인자 밭도 째깐하니 다 죌여불었어.”
<…동네 앞 당산나무/ 눈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회관에서 화토를 치며/ 하루 이틀 보냅니다/ 설도 며칠 안 남았는데/ 설을 쇠면 봄이 돌아오고/ 일할 것을 생각하니/ 눈더미에 눌린 것처럼 힘이 듭니다> (김점순 ‘겨울’ 중)
어매에겐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늘 ‘일할 봄날’이었던 것을.
글=남신희 ‘전라도닷컴’ 기자
사진=박갑철 ‘전라도닷컴’ 기자
※이 원고는 월간 ‘전라도닷컴’(062-654-9085)에도 게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