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영화읽기]‘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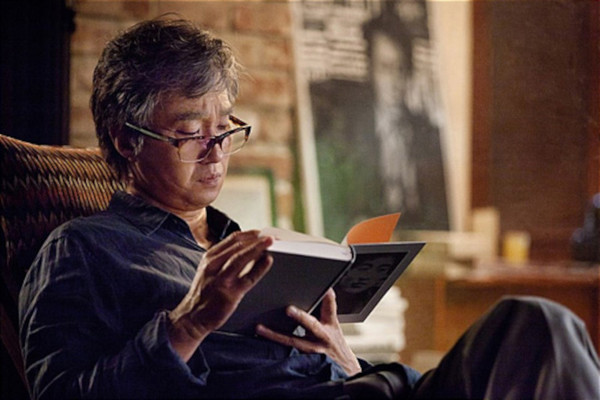
정지우 감독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무도 모르게’라는 영화가 있다. 제인 버킨과 샤를로트 갱스브로가 엄마와 딸(실제로도 엄마와 딸이다)로 나오는 그 영화는, 딸의 엄마가 딸의 중학생 남자친구를 상대로 연애감정에 사로잡히는 영화다.
정지우 감독의 두 번째 영화도 이런 배경에서 헤아려 보면 이해가 된다. 서른 살의 여인(김정은)이 고등학생(이태성)을 적극적으로 욕망했던 것이 ‘사랑니’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 하다면, 박범신 작가의 `은교’는 정지우 감독을 충분히 흥분시켰을 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소설 `은교’는 70살의 시인이 여고생을 흠모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정지우 감독은 자신의 관심사를 더욱 확장해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적요(박해일)라는 시인의 이름만큼이나 적적하고 고요한 숲속 외딴집의 현관문 앞 의자에 여고생 은교(김고은)가 잠들어있다. 때는 여름이 한창인지 소녀는 뽀얀 살갗을 노출한 상태다. 이를 바라보는 노시인의 마음이 동하고, 그렇게 시인은 은교를 마음에 새긴다.
‘은교’의 가장 뛰어난 점은 소설의 영화적 각색에 있다. 그러니까 정지우 감독은 소설에서 인물들의 복잡미묘한 감정의 결이나 서술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영화적으로 영리하게 승화시켜 냈다는 것이다.
가령 이런 것이다. 시인의 자동차 키가 서지우에게 전해지는 소설의 상황을 영상으로 풀어내기에는 복잡한 데가 있다. 한데 영화는 자동차 바퀴 위에 열쇠를 습관적으로 둔다는 재치 있는 설정으로 돌파하고 있으며, 은교의 입에서 수차례 흘러나오는 은어(隱語)를 영화에서는 ‘헐!’(허걱/헉)로 대표화 시키며 시인과 여고생의 관계가 좁혀지도록 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이적요 시인과 서지우 그리고 Q변호사의 시점을 오가며 완성되어지는 소설의 이야기를 이해가 쉽도록 구성해 낸 것, 한 두 마디의 대사를 통해 상황을 압축적으로 전달해 내는 솜씨 또한 일품이다.
이렇듯 ‘은교’는 소설의 각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뭐니 뭐니 해도 소설이 영화로 옮겨지면서 압권인 것은, 이적요 시인이 쓴 영화 속 소설 ‘은교’가 서지우(김무열)가 쓴 것으로 탈바꿈하면서 빚어지는 갈등상황이다.
서지우가 시인의 단편소설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다는 설정은 소설이나 영화나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영화는 박범신 작가와는 다른 길을 간다. 영화는 은교와 무관했던 단편소설을, 이적요 시인이 은교에게 품었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설정함으로서, 세 인물이 오해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한 것이다.
정리해 보면 이렇다. 시인은 은교에 대한 자기욕망을 투사한 소설을 쓴다. 이를 서지우가 훔쳐서 자기 것으로 발표한다. 이를 읽은 은교는 자기를 아름답게 그려준 소설에 매료되고 서지우에게 마음을 준다. 시인이 쓴 소설의 수혜자가 서지우가 되는 아이러니를 영화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이제 두 사람의 섹스를 훔쳐보는 상황이 된다. 이때, 서지우와 은교의 섹스가 시인에게 질투와 배반의 감정을 주기 위해서는 자극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인지 감독은 이 정사장면을 꽤나 강도 높게 연출한다. 이로써 반드시 필요한 장면으로서의 섹스는 완성된다.
영화는 관객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한다. 자연스럽게 시인의 눈과 마음이 되어 섹스를 엿보았던 관객들은, 시인의 극단적인 행위를 심기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보도록 위치 지어진다.
그리고 결국, 이적요시인이 은교의 마음을 얻고자 한 인정투쟁의 욕망이 완성되었음을 목격하게 된다. 이로서 정지우 감독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연애담을 한 편 더 추가시킨다.
조대영 <영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