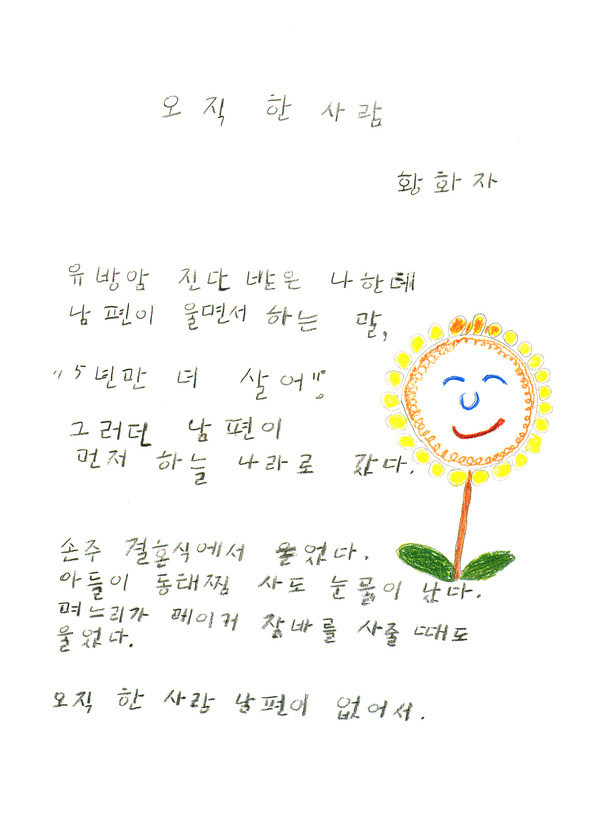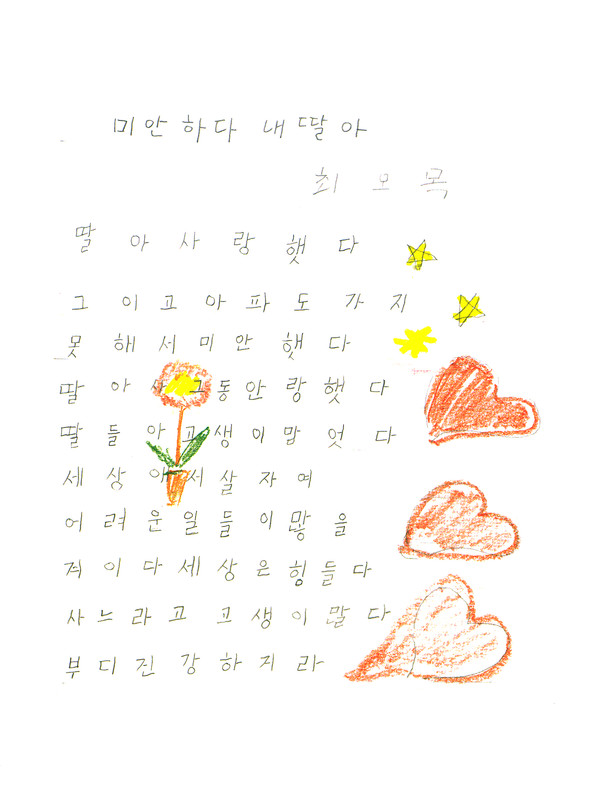[훈짐나게 - 03] 완도 고금비전한글학교 할머니들 시화집 《할 말은 태산 같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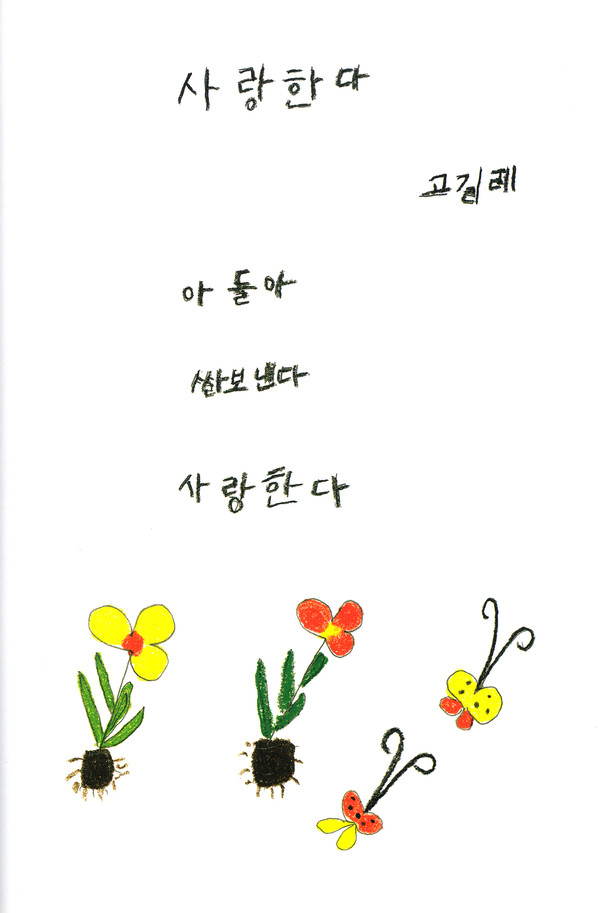
‘사랑’이란 그 깊고 너른 마음을 고길례 어매는 단 몇 글자에 온전히 담아버렸다.
<아들아/ 쌀 보낸다/ 사랑한다>
한평생 손에 조새 들고 호맹이 들고 굴 까고 밭 매온 어매들이 연필을 쥐고 글을 썼다.
사느라 마음속에 묻고 쌓아온 말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할마늘 태삿 갓트나/ 할 수가 없다/ 나 사는 일 마므 할 수가 없다>는 그 맘은 혼자 삭히고 아들네 딸네들한테 하는 말은 늘 <사항한다/ 엄망느 잘 살고 잇다>인 조연단 어매처럼.
완도 고금비전한글학교에서 글을 배운 어매들의 시화집 《할 말은 태산 같으나》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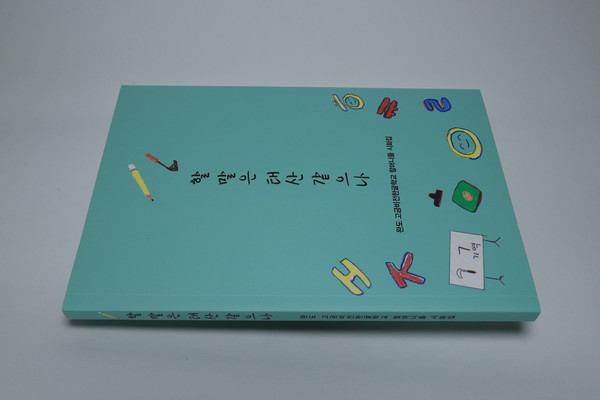
받아쓰기 채점을 하자면 ‘할 말은 태산 같으나’엔 동글뱅이 한 개, ‘할마늘 태삿 갓트나’엔 동글뱅이 두 개를 그려주고 싶다.
‘사랑’보다 ‘살랑’이, ‘보고싶다’보다 ‘보고습다’가 더 몰캉한 온기로 스며든다.
맞춤법의 ‘맞춤’과 ‘법’이 무슨 소용이랴. 눈으로 보기보다 입으로 읽으며 그 말과 맘에 정든다.
새해에 받자옵고 싶은 절절한 축원의 말씀들과 어여쁜 마음들이 한 자 한 자 새기듯 쓴 글자들 속에서 빛난다.
고구마 한 박스 부첫다 질 먹고 거강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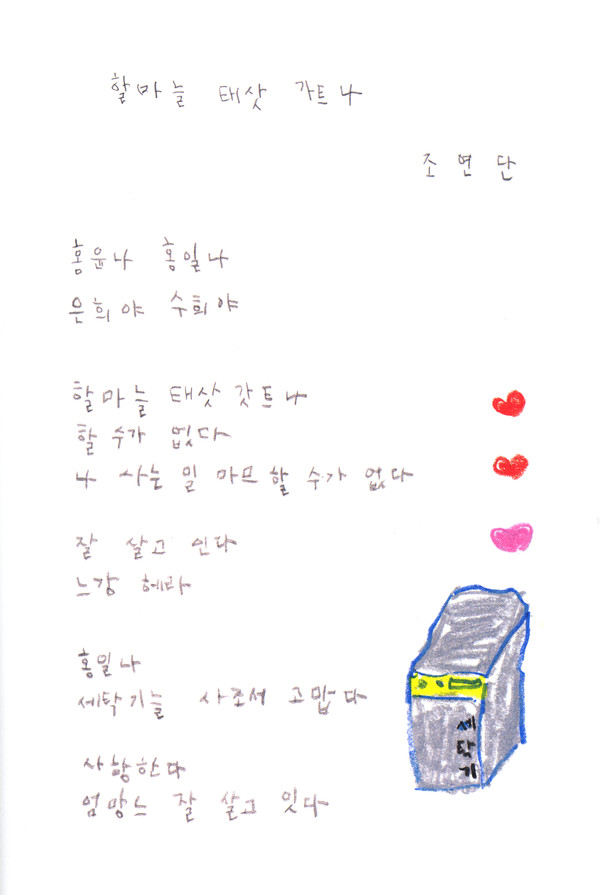
양정자 어매는 <나도 조은 시되(시대) 만나서/ 공부를 하고 인다/ 너머 조다>고 공부하는 기쁨을 말한다.
이홍길(고금비전한글학교 교사)씨가 다문화가정 여성들한테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장항리에 사는 어매들 세 분이 찾아와 “선생님, 저희들은 바닥에서라도 좋으니 한글을 가르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개교 10년 동안 교실을 몇 번이나 옮기며 헌신한 교사들이 있었기에 어매들의 꿈이 지켜지고 이뤄질 수 있었다. 박남수(고금비전한글학교 교장)씨는 “제게는 엄마가 70명이나 계십니다. 조약도와 고금도에”라고, 엄마들을 향한 애정을 말한다.
이의자 어매는 결혼 후 군대 간 남편한테 편지 한 통을 받았단다. 글자를 읽지 못했기에 ‘두 살 무근 어리내 억고(업고)’ 십 리 밖에 사는 언니를 찾아가 편지를 듣고 또 들었다.
어린 시절 학교에 가고 싶어 밤이나 낮이나 울고 조른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아 입학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이 90을 앞에 두고서야 평생의 꿈인 배움을 이룬 이의자 어매는 “어린 마음이로 아버지 가신 것보다 더욱 서러움 거시 공부드라”라고 썼다.
글자를 읽게 된 이렇게 ‘존 세상’에 세월 가는 게 아쉬워 어매는 말한다. ‘바람 갓치 가는 세상 마글 수 음나요.’
‘금 같고 우주 같은 내 아들에게 보내는 엄마 마음’도 글로 썼다.
<너 어렀을 때만 생각하면/ 엄마 가슴이 가리가리 찢저진다// 세월아 어서 가고/ 우리 아들 어서 크라고 했드이/ 바람같치 달일 줄을 몰랐다/ 자불 수가 읍다// 내 아들/ 건강하기만을 빌고 또 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매들한테는 기도이고 시다.
<…박구현 박도현 박지현/ 박상현 박선희 박소희/ 긍강해라/ 한 일마다 다 잘 대라…>(황인엽 어매)
자식들을 향해 오로지 빌고 또 비는 것은 ‘오는도 건강 내이도 건강해라.’
<아들아 고구마 한 박스 부첫다/ 질 먹고 거강해라>(최초덕 어매)
<…면름이(며느리) 넌 고생하고 사는지/ 다 아고 이다// 아프지 마고 건강해나/ 언재나 아프지 마라// 행복하과 사나>(양정자 어매)
<…딸들아 고생이 맘엇다/ 세상애서 살자여/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겨이다 세상은 힘들다/ 사느라고 고생이 만다/ 부디 건강하거라>(최오목 어매)
겅강, 느강, 긍강, 거강…. 애틋하고 지극한 기원들이 바다처럼 출렁거린다.
나 혼자 우리 애들한태 받은 사랑 죄송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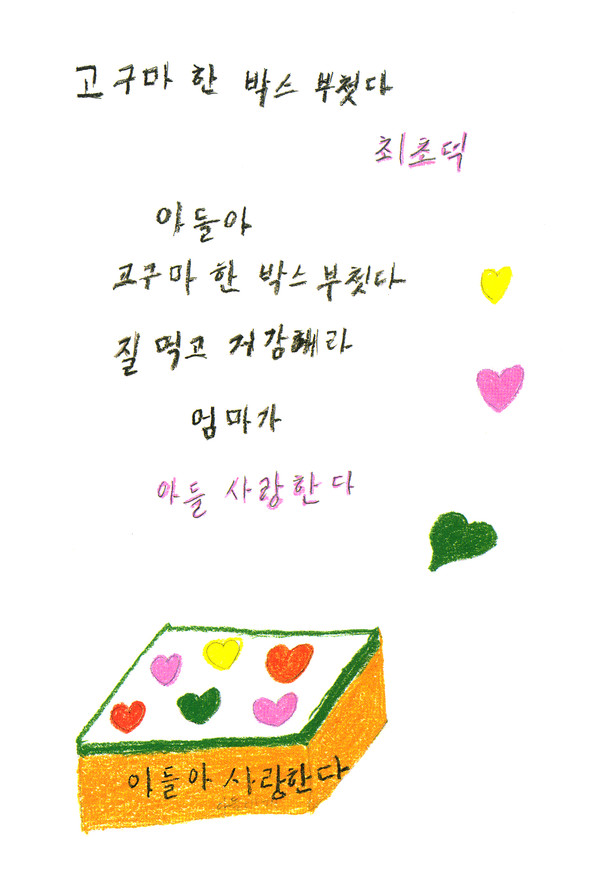
‘다시 모돌든로(못 올 데로)’ 간 이를 그리는 마음도 만난다. <아버지 말쓰이/ 이재는/ 우리 애들 니 난매 잘 키워고/ 학조가지 갈쳐쓰이/ 이재는/ 우리도 먹고 살새// 그 마은 어디 가고/ 다시 모돌든로 가선나요/ 우리 만날까요// 나 혼자 우리 애들한태/ 받은 사랑 죄송하요>(김봉례 어매)
황화자 어매는 큰병에 걸린 자신을 간병하다 먼저 세상을 뜬 남편의 빈자리를 이렇게 말한다.
<유방암 진단 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어”/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난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 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시의 제목은 ‘오직 한 사람’이다.
글=남신희 ‘전라도닷컴’ 기자
※이 원고는 월간 ‘전라도닷컴’(062-654-9085)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