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광주 갈피갈피] 대보름 세시풍속…줄다리기로 시작해 돌싸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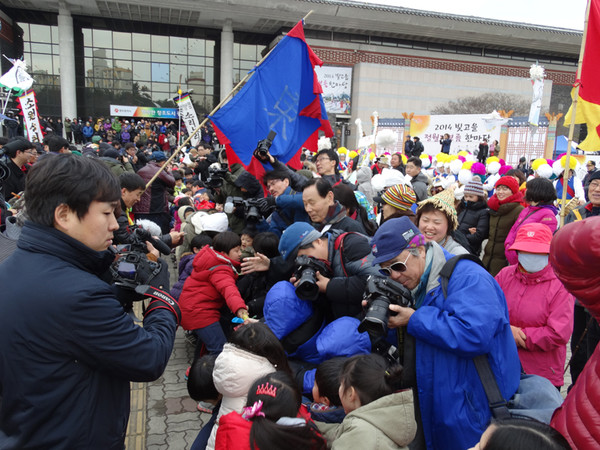
사람들에게 정월대보름은 점차 잊혀져가는 세시풍속이 되고 있다. 사실 대한제국 시절까지도 대보름은 어엿한 명절 중 하나였다. 관공서는 이 날 공식휴무였고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도 이 날만은 휴간하기도 했다. 그만큼 큰 명절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만한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보름 풍속이 어디서나 획일화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많은 지역에서 하는 대보름 줄다리기가 그렇다.
획일화되는 대보름 세시풍속
우선, 대보름 줄다리기가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 탄압으로 쇠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줄다리기는 1930년대 초반까지도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일제가 이를 달갑잖게 여겼고 실제 방해를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오랜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또 요즘 줄다리기는 동·서부 중 서부가 여성을 상징하므로 서부가 이기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믿는 게 거의 일반화됐다. 그래서 대부분 줄다리기는 서부가 이기는 것으로 싱겁게 끝난다. 그러나 서부가 여성을 상징한다는 믿음이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공유되던 관념은 아니었다. 1930년대 담양읍내의 줄다리기에서는 여성들이 줄 근처에 오는 것 자체를 꺼렸다. 여성이 줄을 넘어 다니면 불길하다고 여겨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았을 정도였다.
서부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것도 보편적인 관념이 아니었다. 1925년 함평 읍내에서 열린 줄다리기에서는 서부가 대패했고, 여수 서교동에서 열린 1924년 줄다리기에서는 비록 서부가 이기긴 했지만 이것은 예상치 않게 동부의 줄이 경기 도중에 끊긴 때문이었다.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서부의 승리가 곧 풍년이란 등식을 반대로 이해하기도 했다. 영암읍내에서는 매년 망호천 주변에서 동부와 서부로 나눠 줄다리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동부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동부가 이기도록 부추기지도 않았다. 1924년 영암 줄다리기는 승부를 내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그 해 흉년이 들 징조라고 믿으면서도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격렬했던 대보름 줄다리기
이처럼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줄다리기의 승패는 사전에 정해지는 일이 없었고 그 상징적 의미도 지역마다 달랐다. 그럼에도 줄다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한 격렬함 때문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실제로 줄다리기가 결코 ‘온건한’ 민속놀이가 아니었다는 사례는 많다.
나주의 경우, 전통적으로 성내 성북동에서 줄다리기를 했는데 결전일이 다가오면 같은 집안이라도 속한 편이 다르면 말도 섞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줄다리기 도중에는 부상자가 나오곤 했는데 이는 줄다리기 직전에 벌어지는 장대싸움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
함평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함평에서는 1920년대에 영수교 근처에서 줄다리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예외 없이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부상자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듬해 줄다리기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다.
광주도 격렬함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 1917년 북문 밖 성저리와 누문리 사이에 벌어진 줄다리기는 이틀 동안 속행됐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자 결국 양측 간의 돌싸움으로 번졌다는 기록이 있다. ‘불상사’까지도 줄다리기, 즉 대보름 풍속의 일부로 여겼던 것이다.
전리품으로 가져간 줄의 용도는?
물론 줄다리기가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였음은 분명했다. 1921년 광주읍내에서 남부와 북부로 나눠 줄다리기를 해 남부가 이기자 그들은 관례에 따라 북부 쪽 줄을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져간 줄은 무슨 용도로 썼을까? 담양의 경우가 그 이유를 말해준다.
1930년대 담양읍내에서는 담양교 근처에서 줄다리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긴 편은 줄을 가져다가 자기네 논에 썰어 넣었다. 그렇게 하면 그 해 그 논의 벼가 잘 영근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풍년에 대한 기원이 절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꼭 그 때문에 줄다리기가 격렬했다고 설명하기는 힘들다. 이는 국가대표 선수가 꼭 애국심에서 경기에 참가하고 메달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풍년 이외의 다른 내기를 걸고 하는 줄다리기도 있었다. 1930년대 곡성군 석곡면 소재지에서는 능파리와 석곡리로 나눠 줄다리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긴 마을이 그 해의 도로 울력을 면제받고 패한 마을이 그 몫까지 떠안는 전통이 있었다. 이처럼 승리의 목표가 뚜렷했기에 줄다리기는 격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체가 줄다리기의 진면목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날 우리는 대보름보다 발렌타인데이에 더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이어져오는 대보름마저 지역적 특성이나 상징성을 잃고 획일화되어 가는 것 같아 아쉬움을 준다. 만일 대보름 풍속이 어디서나 천편일률적이라면 우리가 발렌타인데이에 주고받은 초콜릿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다.
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재개관에 즈음해 10여 년에 걸쳐 본보에 연재된 ‘광주 갈피갈피’ 중 광주의 근 현대사를 추려서 다시 싣습니다. 이 글은 2014년 2월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