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커뮤니티의 풍경들]리터러시와 커뮤니티
지난해 ‘가족과 커뮤니티의 풍경들’을 연재한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 가족커뮤니티 사업단 교수진이 올해 다시 칼럼을 이어갑니다. 본란은 넓은 범위에서 가족과 커뮤니티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성찰을 시도합니다. 사업단은 ‘초개인화 시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커뮤니티인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인문학적 성찰과 상상을 바탕으로 열린 가족, 신뢰와 조화의 공동체 문화를 연구·확산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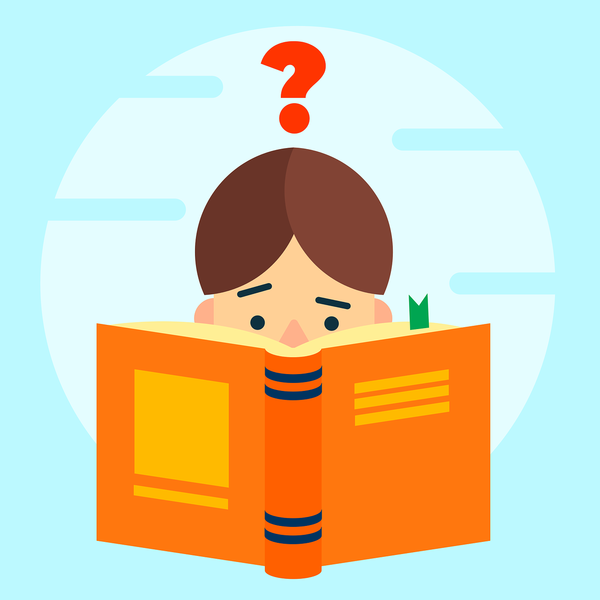
최근 리터러시(Literacy)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리터러시란 “문자로 된 기록을 읽고 쓰며 거기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키며, 우리말로는 ‘문해력’으로 불린다. Z세대의 45%가 ‘심심한 사과’라는 문구의 뜻을 모른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우리는 ‘요즘 애들은 문해력이 한참 부족하다’라고 표현한다. 리터러시는 실질적인 문해 능력의 유무를 따질 때에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해력은 원래의 사전적인 의미일 뿐 요즘 유행하는 리터러시와는 결이 다르다.
과거에는 문자를 중심으로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에는 음성·사진·영상·코드·디지털 기술의 작동 원리 등을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때 리터러시는 단순한 문해력을 뛰어넘어 기술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를 자연스럽게 다루지 못하여 스스로 민망하거나 뒷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가 한참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현재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의 단어의 뜻을 모르는 Z세대의 문해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의 디지털문해력을 넓혀가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경우든 리터러시의 부족은 개인활동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리터러시 능력은 사회의 변화를 읽고 적응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곧 한 사회나 커뮤니티의 권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전통시대에는 한자를 익히고 한문을 읽고 쓰면서 이해하는 리터러시가 중요했다. 때문에 사대부가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천자문과 사자소학을 필수적으로 가르쳤는데, 이것은 당대 가장 기초적인 리터러시의 출발점이었다.
관료 진출의 관문인 과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문리터러시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문리터러시는 가학(家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부모-자식 또는 친인척 어른-아랫사람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한문리터러시를 교육하는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위계질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로 작동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맹자’와 ‘춘추’ 등 한문 텍스트를 읽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한문리터러시를 체득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만약 자녀들이 이러한 한문텍스트 읽기를 게을리할 때 정약용은 준엄하게 꾸짖었으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였다. 한문리터러시와 공동체 구성원리가 일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과거 한문리터러시로 구축되었던 사회구조는 오늘날 매우 다양한 리터러시로 재구축되었다. 자녀가 태어나면 한글을 가르치거나 또는 한글을 떼기도 전에 영어 유치원 등을 보내며 영어를 필사적으로 가르친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학원에도 보낸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국어나 수학 학원에 보낸다. 다양한 영역의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성장하여 사흘과 나흘을 구별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막상 10여 년에 걸친 리터러시 향상 교육은 실패한 셈이다. 오로지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한 문해력 향상교육이 오히려 실질적인 문해력 저하를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리터러시 영역의 다양화는 리터러시 습득 능력의 세대 간 차이로 인하여 오히려 기존 리터러시 권력을 약화시키고 권위를 해체하며 위계질서를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기술의 발전은 리터러시 영역의 확장을 가속화하였다. 기술 영역에서의 리터러시는 본질적으로 생득적이다.
핸드폰은 60여 년의 삶의 경험을 축적한 할머니나 할아버지보다 태어난 지 4~5년 밖에 되지 않은 손자가 더 잘 다룬다. 비대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법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 또한 20~30여 년 교단에 선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더 익숙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세대에 비해 압도적인 리터러시를 갖춘 어른에게 자연스럽게 부여되었던 권위는, 리터러시 체계의 다양성을 통해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리터러시가 없는 권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세대 간의 갈등의 출발점은 리터러시에 대한 능력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도 볼 수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리터러시 영역의 확장과 다양화는 기존 커뮤니티 내의 전통적인 질서를 흔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꼭 위기로 여기거나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 기술 발전에 따른 리터러시의 독점으로 전혀 다른 위계질서가 생성되고 있는 과도기일 뿐이다.
당분간은 리터러시 영역의 다양화와 확장이 가장권, 교권 등 다양한 사회적 권위와 세대 간 위계질서를 흔들 것이지만, 오히려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당연히 부과되었던 리터러시 권력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평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꿈꿔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상은 늘 이렇게 불편한 방식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이겨왔기 때문이다.
박미선(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