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비율 달성 ‘한 번뿐’…부서 간 편차도 심각
법으로 정해진 ‘1.1%’…광주시는 매년 미달
광주시 “지정시설 부재, 구조적 한계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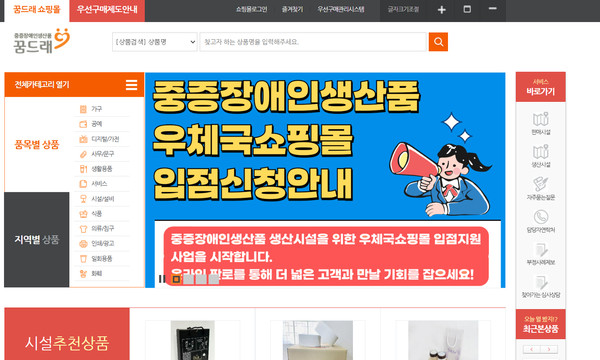
광주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으로 정해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달성한 것이 한 차례 뿐이어서 장애인 지원 정책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해마다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2023년(1.3%)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조례로 ‘3% 이상’ 구매를 권장하며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법률상 의무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 저조한 구매 실적은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주시 내부 부서별 구매 실적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올해 8월말 기준 노동일자리정책관(7%), 여성가족국(6.9%) 등 일부 부서가 높은 구매율로 전체 평균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부서는 구매율이 0%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제도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복지건강국조차 8월 기준 누적 구매율이 0.27%에 불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돼 있다”며 “학술용역, 설비공사, 정보통신 감리 등 주요 예산 지출 항목에는 장애인생산시설이 지정돼 있지 않아 실적을 올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장애인생산시설의 품목은 대부분 사무용품, 위생용품 등 단순 물품에 그치는데 광주시의 주요 예산 지출 항목은 연구용역·공사·행사 등으로 장애인생산시설에서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으로 구매율을 채우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넘어서기 위해 부서별로 ‘이런 물품은 여기서 구매하라’고 안내하고 싶어도 지정된 생산시설이 없어 실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며 “복지부에 ‘설비공사·정보통신 감리 분야에는 우선구매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올려둔 상태”라며 “이 부분이 조정돼야 현실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기간 시 산하기관들은 대다수가 법적 구매율을 충족해 연말 기준 실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광주시가 법적 기준인 1.1%도 달성하지 못한 당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20.5%의 구매율을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5개 자치구들도 최근 5년 동안 대부분 구매율을 충족시켰다. 동구의 경우 2023년 0.92%, 2024년 1.05%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올해 8월말 기준 1.01%여서 연말까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매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서구는 같은 기간 1.34%, 광산구는 1.44%로 기준치를 이미 넘어섰다. 북구는 0.53%에 그치고 있다. 반면 남구의 경우 2.54%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61%로 5개 자치구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이에 광주시는 자치구와 달리 구매율을 높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라도 살 수 있지만 시에서는 안된다”며 “시와 자치구의 상황이 다르다. 종이컵이나 A4용지 외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돼 있다는 문제와 함께 낮은 실적이 매년 반복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의무비율 미달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규정은 없다. 복지부는 매년 실적을 취합해 평가하지만,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계도·교육’에 그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서별 실적이 아니라 시 전체 실적을 복지부가 평가한다”며 “구매율이 0%인 부서라도 패널티를 주긴 어려워 구매를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취약계층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제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생산품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예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는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없는 수준이다. 법정 의무비율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

